우리 함께 오래오래
글쓴이: 정은지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에서 활동가이자 디자이너로 일하고,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TTBW를 운영하며 웹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회문제와 지역의 일에 관심이 많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세스를 다듬는 일을 즐긴다. FDSC에서는 지역지부와 빅활동 SEE-SAW,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페디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9시 6분, 선아 님께 걸려온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은지 님~ 일어나셨어요? 회의 시작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눈 비빌 새 없이 컴퓨터 앞에 앉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누군지 묻지 않아도 운영팀장 인아 님이 분명했다.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갈게요!” 급한 목소리로 연신 사과하며 2021년 FDSC의 마지막 운영회의 링크를 클릭했다. 회의 링크에 접속하자 컴퓨터 화면에 스피커폰으로 내 목소리를 다른 운영진에게 들려주며 깔깔 웃고 있는 인아 님의 모습이 꽉 차게 보였다.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FDSC는 2018년 7월 50명의 디자이너와 시작해 2021년 현재 1년 차부터 26년 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180여 명의 디자이너가 교류하는 소셜 클럽이다.
FDSC 운영진은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 회의는 각자의 안부를 전하는 일로 시작된다. 일이 많아서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람부터 어제 늦게까지 청춘을 즐기느라 지금은 조금 졸리다는 사람, 배고파서 뭘 좀 먹으면서 하겠다는 사람까지 한 명 한 명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후에는 각자 맡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노력에 손뼉 쳐주기도 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고민을 나누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번 회의는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인 탓도 있겠지만. 많게는 14명까지 참여하는 운영진 회의가 3시간을 꽉 채워도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에 못다 한 말을 전하느라 랩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의견을 내는 일이 지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저번 회의의 안건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인아 님이 준비해주신 회의록 문서에 들어가 보니 롤링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로의 장점 써주기, 2021년 본인의 활동, 2022년에는 뭘 하고 싶은지, 활동하며 어떨 때 힘들었는지 쓴 후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도록 3~4명씩 소그룹으로 조를 만드는 형태였다.
롤링페이퍼 작성을 마치고 조를 나눠 서로 장점을 읽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2022년에 담당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이하 페디소)를새롭게 구성하고 싶다고 썼다. 페디소는 SNS를 통해 우리 클럽의 회원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디자이너의 경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작업물을 통해 본인을 소개하는 문법이 익숙하고 깔끔하다. 그래서 페디소도 포트폴리오와 회원 소개 글을 올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작업을 외부에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본인의 작업이 포트폴리오로 내세우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답변이 너무 ‘아쉽지만’ 페디소에 소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로 이어진다. 사실 나도 페디소 운영을 맡기 전 섭외를 요청받았을 때 같은 말을 했었다.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 작업한 결과물은 공유가 불가능하거나 내보이기엔 애매한 규모의 작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올라와 있는 멋진 페디소 작업들을 하나 둘 확인하며 ‘내가 페디소에 적합할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거듭 던졌고, 참여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보내야 했다. 그렇지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페디소 운영을 맡게 되고 섭외를 진행하면서 내가 했던 답변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 적합한 유형이 아니라 참여가 어렵다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페디소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나의 생각은 페미니즘 자료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스터디 그룹 ‘디자인 서당’에 참여하며 또렷해졌다. 특히 마사 스코폴드의 <지저분한 역사 대 깔끔한 역사: 그래픽 디자인의 여성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위하여>를 읽으며 고민에 힘이 실리고 해결의 단서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중요한 페미니즘적 사유는 여성의 사적 역할과 공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연결은 수행하는 작업, 작업 방식과 그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 … 여성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디자인물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를 넘어서는 전기나 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를 살펴보든 여성은 제한이나 기대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이 있었다.’
‘그렇다면 디자인, 그 산물은 어디에 있는가? 디자인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디자이너나 이들의 결과물에 집중하여 그래픽디자인 역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 활동, 역할,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및 그렇지 않을 조건을 발견해내야 한다. 이러한 그래픽디자인의 사회적 역사는 곧 보다 넓은 범주의 활동, 사람과 사물, 여러 역사적, 문화적 분야에서 온 사유의 적용 및 방법론을 요구하는 관점이다. 이는 복잡하고, 정의를 벗어나며, 지저분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들이 거쳐간 후 나는 페디소의 한계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놓여 있는 구조와 상황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익숙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소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기울어진 구조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도 여성 디자이너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고민을 홍보팀에 나눴더니 모두들 공감과 지지를 해주었다. 그리고 함께 포트폴리오로 소개하는 익숙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페디소 2.0을 기획해보기로 했다.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일, 디자인에 담길 정보를 정리하는 일 등등. 매끄러워 보이는 포트폴리오의 이면에는 지면 아래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 뒤편에 있는 고민과 과정에 주목하고, 디자이너 각자가 잘 드러낼 수 있는 소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페디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여성 디자이너의 작업이 지면 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였다. 여성 디자이너를 더 많이 소개하는 활동이 필요했고 새로운 시도였다. 그리고 페디소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지금, 또다시 익숙함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익숙함에 틈을 내고 현재의 기류에 맞도록 유연하게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처음 해보는 시도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 설렌다. 무엇보다 이 고민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 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새날 님이 해준 말이 마음에 따뜻하게 남았다. “근데... 은지 님! 이거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같이하는 거 알죠? 우리 함께해요!”
성평등 탈위계 문화 조성을 주제로 FDSC의 운영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계와 불평등은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처럼 익숙함을 답습할 때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회사를 다니며 위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성평등에 관한 의견을 전하면 주로 ‘그건 당연히 힘든 거다.’, ‘이미 안정적이고 익숙한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불편함을 말하려면 힘을 바짝 끌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여러 겹을 둘러쌓아 의견을 전달해야만 했다. 그러니 불편함을 전하는 과정에는 불안함이 뒤따라왔다. 불편을 해소하길 바라는 내가 욕심 많은 별종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FDSC 활동을 하면서 힘주지 않고도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동료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이 안정적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상황을 뒤집어보며 우리가 정말 안전한지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편함을 끄집어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야만 이 안정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불편을 꺼내는 일은 불안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의 과정일 뿐이라고 가볍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FDSC 커뮤니티 활동이 당장 나의 업무환경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안다. 다만 우리의 활동이 쌓이고 겹쳐지며 이어진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익숙해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걸 믿는다. “은지 님! 이거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같이하는 거 알죠? 우리 함께해요!”라고 말해주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손을 잡고, 관계를 이어가고, 함께 돕고 오래오래 버티며 새로운 지면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NONE: 넌> 2021 프로젝트 보기 > 칼럼, 좌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름'의 품격 - 김보린 (0) | 2021.11.28 |
|---|---|
| 10대 성/평등 교육을 둘러싼 현장들 - 강동희 (0) | 2021.11.28 |
| 권위와 위계 - 이택광 (0) | 2021.11.28 |
| 새로운 시대의 대중문화와 참여의 의미 - 정지우 (0) | 2021.10.27 |
| 둘 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 완전히 나의 것은 아닌 그런 말 : 『예의 있는 반말』에 관한 짧은 리뷰 - 정동규 (0) | 2021.10.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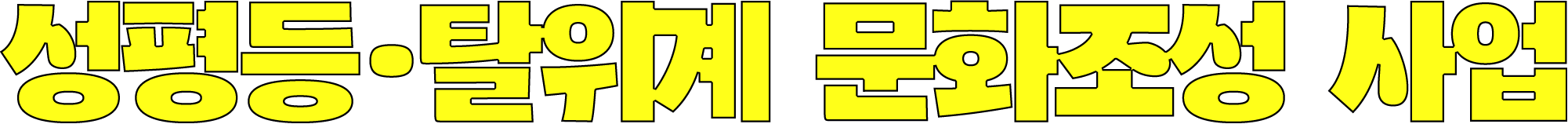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