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와 위계
글쓴이: 이택광(문화비평가)
우리는 보통 권위와 위계를 혼동한다. 물론 후자가 전자를 만들어내는 물질적 토대인 것도 사실이다. 권위는 모든 조직의 작동 방식이다. 그렇기에 권위와 위계는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계가 필요하고, 위계가 있기에 권위도 지속한다. 그러나 엄연히 둘은 서로 다르다. 위계 없는 권위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인격들은 위계를 파괴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한다. 말하자면, 위계는 권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권위가 위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작동시키는 필수 요소로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꼽았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그 권위의 영향력을 위계로써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봤다. 기존의 위계를 허물고 새로운 권위를 세운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정치적 사건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카리스마는 변화의 완료 시점에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카리스마의 휘발성을 화석화하려는 위계에 집착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권위적인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면, 한국 사회는 권위보다 위계에 더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권위가 쉽게 서지 않기 때문에 위계를 세우려고 하는 셈이다. 물론 이런 전도는 베버가 말한 ‘합리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버의 ‘합리화’라는 것은 시장의 교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절대적인 판단이 가치 평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교환의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첨단의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곳이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한국에서는 기복의 수단일 뿐, 절대적인 신을 믿는 의식이 아니다. 종교조차도 무신론자의 도구가 되는 곳이 한국이다.
이런 초합리성의 사회에서 권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면극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절대적인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절대적 권위는 항상 희화화를 동반하고, 어떤 권위에 대한 진정성은 ‘광신’으로 비쳐진다. 그러므로 이 감정 상태는 항상 역설적인 자기 부정에서 맴돈다. “사실 나는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지만~”이라는 수식어가 어떤 권위의 실행에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나 이 자기 부정의 과정에서 이미 권위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본질 없는 권위가 바로 권위의 본질인 것이다. 위계는 바로 이 공허한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이 위계의 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이다.
권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왜 위계는 필요한 것일까. 수단과 목적이 서로 뒤바뀐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전도 현상은 도착의 일종이다.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권위를 언제든 복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위계를 지키는 까닭도 그 부재한 권위에 대한 전제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구조는 이런 메커니즘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위계란 것은 이해관계를 지키는 수단인 셈이다. ‘유연 노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노동현장의 탈위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쿠팡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탈위계는 촘촘한 감시의 조직화라는 또 다른 위계의 도입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감시라는 것은 탈위계라기보다 위계적인 것이다. 상호 감시조차도 사실상 체제의 시선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의 실현이다.
어떤 체제의 시선인가, 이 질문을 빼놓으면 위계의 기만에 속을 수 있다. 권위와 위계의 착각은 이런 기만에서 출현한다. 권위는 평등과 충돌하지 않지만, 위계는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둘을 혼동함으로써 위계를 권위의 현신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위계를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위가 통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계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이 위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법체계이고, 이른바 내규라고 부르는 규율이다. 규율은 위계를 떠받치는 권력의 작동방식이다. 이 권력의 작동 방식은 신체에 각인됨으로써, 일종의 습관으로 남는다. 우리는 규율을 통해 습관적으로 위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종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른바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이다. 훈육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위계를 지탱하는 가장 실체적인 물리력이다.
말하자면, 권위와 달리, 위계는 폭력을 통해 유지 가능하다. 위계를 거스를 경우, 폭력을 감내해야한다. 노동 현장에서 위계를 거스른다는 것은 작업장을 이탈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위계적 폭력이 목표로 삼는 것은 자발적 복종이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다. 위계가 목표로 삼는 것은 권위 없는 자발적 복종이다. 권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위계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위는 매력을 전제한다. 매력적인 인격만큼 위계에 두려운 위험은 없다. 이 매력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이 위계의 목적이다. 어떻게 위계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탈권위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NONE: 넌> 2021 프로젝트 보기 > 칼럼, 좌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대 성/평등 교육을 둘러싼 현장들 - 강동희 (0) | 2021.11.28 |
|---|---|
| 우리 함께 오래오래 - 정은지 (0) | 2021.11.28 |
| 새로운 시대의 대중문화와 참여의 의미 - 정지우 (0) | 2021.10.27 |
| 둘 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 완전히 나의 것은 아닌 그런 말 : 『예의 있는 반말』에 관한 짧은 리뷰 - 정동규 (0) | 2021.10.27 |
| 흉(凶) - 이옥수 (0) | 2021.09.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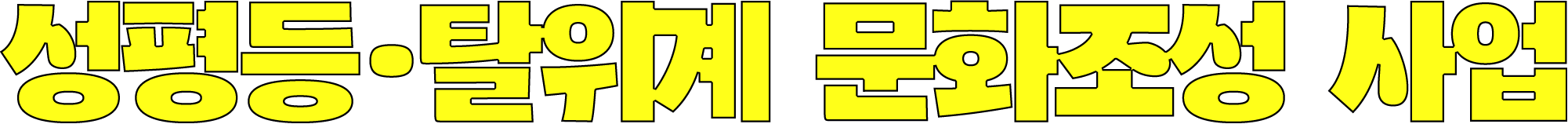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