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임기택과
게으르게 움직이고 게으르게 씁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꾸준히 쓰려고 노력합니다.
모름지기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꼼꼼히 날짜와 시간도 살피고, 진행자도 살피고, 커리큘럼도 살펴야만 하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는 주제에 어느 정도 날짜와 시간이 맞는 것 같다면 덜커덕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게 고질병이다. ‘배워서 남주냐’, ‘어쨌든 경험해봐서 나쁜 건 없다’, ‘경험은 남는다’ 같은 말들을 주워섬기면서 말이다. 그래도 한 번은 더 커리큘럼을 살펴볼걸. 딱 한 줄. 대본 읽기라는 한 줄을 제대로 봤더라면, 이후의 진행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작업 윤리’라는 4글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윤리라니.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선한 인간. 악하진 않은 인간. 아주 나쁘지는 않은 인간. 무해한 인간. 아주 조금만 유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무해해지려 노력하는 인간. 이 되고 싶은 열망 앞에 나머지 내용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아니었었다.
번갈아가며 각자의 이름과 작업,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있노라니 살짝 정신이 아득해졌다. 물론 얼마든지 나와 다른 장르의 작업을 업으로 삼는 이들과도 워크숍을 듣고 작업윤리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렇지만 참가자의 9할이 자신을 연극 작업을 하는 배우 혹은 연출이라고 소개했을 때 아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자기소개 시간까지는 괜찮았다.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였으니까. 나도 연극작업이라는 거 해봤는데? 연극제 일도 해봤고, 가끔 크루 알바도 하는데? 쫄 필요 전혀 없었다. 예술 작업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과도 워크숍을 들어봤고 시각 예술가들과도 작업을 해봤다. 쫄 필요는 전혀 없었다.
필요는 없는데 쫄았다. 왜? 자기소개 이후 흩어진 테이블에서 예고한 대로(그리고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대로) 대본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본 낭독의 시간. 정말 담담하게 낭독을 하면 좋으련만, 전문적인 훈련에 이골이 난 배우분들의 낭독은 이미 연기 그 자체였다. 나도 굴하지 않고 내가 맡은 부분을 읽어 내려갔지만 왜 오늘따라 목소리는 맹맹하고 발음도 자꾸 새기만 하는지. 자연스럽게 읽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읽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 매 대사가 오고 갈 때마다 느꼈다.
그 쪽팔림과 불편함에서 벗어나 재빨리 워크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결점이 필요했다. 알량한 연극 관련 작업 경험? 아니었다. 똑같은 신체를 활용한 공연예술이란 점에서의 신체 인지? 더더욱 아니었다. 간이 대본으로 간이 상황극을 소환한 워크숍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관객으로서의 경험이었다. 이 판단은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의식하기도 전에 착착 진행됐다.
한 발짝 뒤에서 이 창작과정을 바라보다 보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압권은 다음과 같았다. 대본에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공연 날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변경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설정된 연출이 배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근거로 수용을 종용하는 장면이 있었다. 워크숍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말미에는 짧은 창작의 결과를 다른 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계획이 있었고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씩 풀려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자칫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결과물’을 위해서 ‘시간이 짧으니’ ‘중요한 것’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대본 속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리고 이 지점이 팀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모두가 같은 지점을 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 도리어 이 지점에서 우리 팀의 결과물이 흥미롭게 흘러갔는데 대본과 현실이 겹치는 지점이 있다면 이를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의 상황을 대본과 역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본 읽기, 역할 나누기를 통한 결과 수행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창작윤리에 대해 감각하고 고민하는 지점을 나누는 이야기 자체를 결과물로 만들기로 했다.
그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다른 참여자들처럼 팀 안으로 한발짝 더 들어갈 수 있었다. 연극인은 아니지만, 창작자이긴 하니까. 공동 창작의 경험을 이어오면서 이런저런 공연을 만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야기의 흐름은 깊이 있게 창작 과정에서의 윤리에 집중했고, 각자가 갖는 개별적 특성과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자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나갈 사람을 구하는 방법도, 창작을 위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 갖는 생각도, 폭력적 순간을 마주할 때 대응하는 방법도, 윤리적인 창작을 위해 지향하는 지점도 각자가 달랐다. 그리고 서로의 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하며 쌓은 독자성이 가장 도드라진 지점은 함께 창작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정하는 방식에서 드러났는데, 나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진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결이 맞는 사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윤리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창작을 지속해오며 지난 시간을 보내왔다. 그 결과로 업계에서의 명망이나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무해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반대로 어떤 참여자는 작업의 지속을 위해 비윤리적인 순간을 견뎌내며 그 안에서 비교적 윤리적이거나 윤리적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쌓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폭력과 비윤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작업자로, 창작자로 살아남는 데에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더욱 본인이 원하는 창작 과정에 가까이 다가선 경우도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과 독자성이 더 드러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연결감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건 집단 예술이라고도 불리는 공연 예술계에 있으면서도 부조리나 비윤리에 마주할 때 홀로 가질 수밖에 없던 불안감이 혼자만의 것, 유별난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연결과 안정이었다.
각자의 위치와 상태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윤리적인 창작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
그리고 이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는 단지 이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점과 지점에 따른 고민을 나누며 그것을 데이터 삼아 더 나은 지점, 더 나은 방법, 덜 위해적이고 덜 비윤리적인 창작과정을 고민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아쉬운 부분이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함이었다. 담당자분의 말마따나 1박 2일로 진행됐더라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이 때 마무리가 되다니. 만화 속 악당의 단골 대사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래서 마지막 맺음에 한결 안도할 수 있었다. 1회로 종료되는 워크숍이지만 워크숍을 포괄한 전체 프로그램과 시도는 이어질 거라는 말씀에, 변방의 개인 창작자는 다음의 프로그램과 연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설 수 있었다.
'<NONE: 넌> 2021 프로젝트 보기 > 워크숍 1차 : 창작윤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참여자 리뷰 - 정혜정 (0) | 2021.10.27 |
|---|---|
| 창작윤리 워크숍 소개 (0) | 2021.10.01 |
| 창작윤리워크숍 대본/수정대본 (0) | 2021.10.01 |
| 창작윤리워크숍 현장 스케치 (0) | 2021.09.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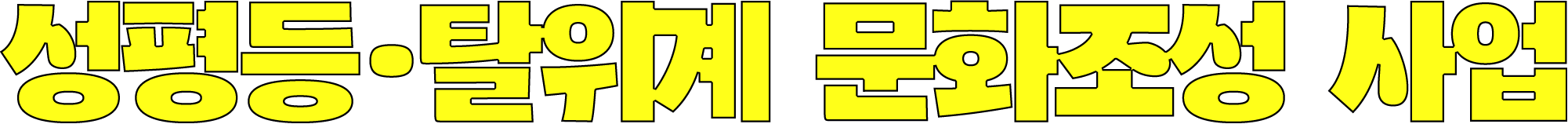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