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우롱센텐스
(반폭력, 친여성주의, 폐쇄적 문창과·문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문학 창작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프로젝트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지만
<NONE:넌> 지원사업 운영위원에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롱센텐스는 정말 ‘미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팀으로 ‘뽑힌’ 주제에 <NONE:넌> 기획 의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멈춘 적 없었고, 관대하게 보자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닌 주제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영위원들이 이 사업의 여러 진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갈망하는 만큼, 우롱센텐스 또한 평등한 문화예술계 환경 조성에 대한 간절함이 강했던 것 같다. 말하자면, 바로 여기, ‘성평등 탈위계 문화조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롱센텐스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애처로운 기분이 들었다. 아직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토대를 비판하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목표는 크게 부르는 것이라지만
<NONE:넌> 지원사업은 성평등과 탈위계라는 아주 거창하고 거대한,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2016년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위력관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밝혔고 창작과 예술의 이름으로 낡은 관성을 유지하는 변명의 민낯을 들추었다. 우리 모두는 2016년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얼룩진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얼마나 고된 작업인가. 더욱이 물감에 푹 젖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도화지를 구겨 던져버리고 아예 새로운 흰 도화지를 마련할 수도 없다면. 도화지 한 장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없는 일이라면.
‘성평등’과 ‘탈위계’는 문화예술계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당위가 되었다. 우롱센텐스가 참여했던 ‘지원사업’ 안에서 <NONE:넌>의 운영위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예술계의 팀과 조우하게 하고, ‘평등약속문’을 같이 만들고, 운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 관계 형성을 꾀했다. 그 과정 속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번이라도 마주친다면 금방 친구로 지내고 싶은 명랑한 사람처럼 자주 등장했지만, 상상 속 친구처럼 각자의 아주 개인적인 맥락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평등’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의 전제와 조건을 성찰하고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롱센텐스가 사업 참여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를 동료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운영위원들은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성평등’과 ‘탈위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 안에서도 대체로 전제가 합의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지원사업 참여 과정 속에서 여러 참여 팀을 만나기는 했지만 ‘성평등’과 ‘탈위계’라는 거대한 주제를 각자의 팀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을 충분히 공유하지도 못했고, 모든 만남은 ‘수다’여야 하는지, ‘논의’여야 하는지 목적도 불분명했다. 운영위원들은 창작 지원 사업의 전형적인 행정 및 실무위원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것이 ‘운영위원’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밝혀낸 것은 아니었다.
이 사업에 있어 ‘문화 조성’ 내지 ‘환경 조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성평등’과 ‘탈위계’는 ‘지원사업’의 형태로 구현될 때, 어떠한 조건과 전제를 가져야 하겠는가?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의 참여자이자 문화예술계 문화 조성에 영향을 끼칠 당사자로서 ‘성평등’과 ‘탈위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겠는가? ‘커뮤니티형’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모임과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고민과 전제가 충분히 영글어지지 않은 채 맞이한 ‘예산분배토론회’는 ‘규제 기준’과 ‘규제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이 부재했고, 구체적인 어젠다를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사업 참여 팀 간의 오해와 갈등을 오로지 각자의 팀끼리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지원사업’의 형태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평등’의 다른 말은 ‘권위 없음’이 아니라, ‘평등의 조건과 전제 합의’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자원이든, 물질적 자원이든)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집행자의 존재’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사업’ 형태에서 실무집행자가 역할의 범위를 제안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부담은 오로지 참여 팀들의 개인 각각이 감내하게 된다. ‘운영위원’이 그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고르고 그들을 모이게 하는 데에 역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환경 조성에 의무가 있는 구성원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세심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운영위원’과 ‘참여자’ 사이의 관점 조정이다.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모두가 발언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계 구성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감각은 ‘성평등’과 ‘탈위계’ 의제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구성원들을 동료로 인식하는 과정과 관점에 대한 감각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원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돈을 받고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단기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노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과 작품 사이, 작업과 작업 사이에도 꾸준히 문화예술계 구성원으로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시간들은 자칫 우리 스스로도 잊기 쉽다. 작업에 따라 공간도 소속도 이리 저리 바뀌니 이렇다할 고정적인 연대감이나 연대단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공론장을 갖는 것도 막연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연결’ 이상의 ‘연결’이 필요하다.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동료애가 아니라, 확실하게 서로를 동료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을 둘러싼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이 모든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꺼이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며 사업의 끝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뒤돌아 보고 그대들의 발자국을 들여다 보는 이유일 것이다.
'<NONE: 넌> 2021 프로젝트 보기 > 지원사업<NONE:넌> 기록+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ONE:넌> 참여 후기 | 최소예산신청자의 자율예산제 체험기 - 최서윤 (0) | 2021.09.30 |
|---|---|
| <NONE:넌> 참여 후기 | 제도를 함께 만드는 제도 - 루이즈더우먼 (0) | 2021.09.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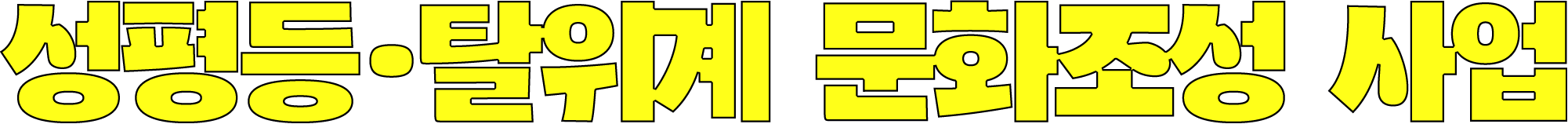


댓글